2025. 3. 23. 09:58ㆍ대순회보
교무부 윤미정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가르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여러 위치에서의 가르침이 모두 중요하지만, 선각으로서 수반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데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 수반을 대순진리회의 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상제님을 받드는 수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효과적인 가르침은 수도인 대부분이 지닌 관심 대상일 것이다. 특히 수반으로부터 반감을 살 때가 선각으로서 난감한 상황인데 이러한 반감은 보통 교화하는 사람이 자신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강요만 할 때 생기기 쉽다.
여기서 우리는 반감을 사지 않고 효과적으로 후각을 이끌기 위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전님께서 ‘도인은 수기치인(修己治人)하라’라는 주제로, “내 몸 닦음이 곧 가르치는 근본이 되느니라.”01라고 강조하신 말씀도 이와 관련된다. 수기인 내 몸 닦음이 가르침의 근본이 됨을 밝히신 것이다. 그러므로 후각을 상제님의 도인으로 이끄는 데 있어 수기가 왜 근본이 되는지 수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수기치인은 ‘자신을 닦고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상제님께서 많이 읽으면 활연관통(豁然貫通)한다고 전하신 『대학』 상장(上章)02의 주요 내용이다. 이 말은 『논어』 「헌문(憲問)」편에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군자에 관해 물어보자 공자가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 자신을 먼저 닦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03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학에서는 성인, 즉 내적으로 덕성을 함양하고 외적으로는 덕치에 의한 정치적ㆍ사회적 성취를 이룬 내성외왕(內聖外王)과 덕치에 의한 이상세계를 목적으로 한다. 수기치인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군자의 실천 덕목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은 후에 타인과 세상을 덕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04
수기와 치인은 상제님께서 “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글을 외워두라고 하신 말씀05에서 또한 우리 수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정심(正心)과 수신(修身)은 수기(修己)에 해당하며, 제가(齊家)와 치국(治國) 그리고 평천하(平天下)는 치인(治人)에 해당한다. 우리 수도는 개인 수도를 넘어 타인을 구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데(治人)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도의 기본사업인 포덕ㆍ교화ㆍ수도가 수기와 치인의 측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도에서 수기와 치인이 동시에 강조되는 이유는 수도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 수기는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여 인격을 완성하고 도통군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인은 타인을 도와 그가 인격을 도야하고 본성을 회복하여 도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신과 타인이 서로 인격을 완성하여 도통진경에 이름으로써 지상천국건설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기와 치인은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때 수기는 치인의 전제이며 근본이 된다. 도전님께서 포덕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언행과 처신을 바르게 하라고 하신06 말씀도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다.
수기가 가르침, 즉 치인의 근본이 된다는 의미로 하신 도전님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상제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 종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천지 분란지사(天地紛亂之事)도 자아유지하나니”(교법 3장 29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천지의 조용한 일도 나로부터 비롯되고, 천지의 분란한 일도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의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나’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타인이 그 인격을 완성하도록 돕고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도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출발점이 된다.
도주님께서도 “먼저 나의 마음을 참답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되게 하고, 먼저 내 몸을 공경함으로써 남도 몸을 공경하게 되며, 먼저 나의 일을 신의로써 하면 남들이 신의를 본받게 된다.”07라고 말씀하셨다. 타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기는 타인을 상제님의 진리로 거듭나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수기가 말없이 행동으로 가르침을 베푸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평소에 보고 들은 것을 은연중에 따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권위를 가진 이의 언행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가르치는 사람의 언행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임원의 올바른 언행이 특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선각의 책망만 듣는 후각은 자기 수반들을 책망으로 이끌기 쉽고, 선각의 자애로움을 경험한 후각은 자기 수반들에게 자애롭게 대하기 쉬운데, 이것이 모두 임원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른 수도 자세는 실생활에서 살아있는 교육적 체득의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선각의 바른 언행과 처사에는 논리적 설득을 넘은 정서적 감화의 힘이 있다. 바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실천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안다. 바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마음의 감화가 바로 그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모범적인 언행이 수반에게 미치는 감화는 그 마음을 움직여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언행의 본보기를 통한 교화의 효과는 그 무엇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다. 이같이 수기는 수반이 임원의 모범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또 그것에 감화되어 실천할 동력을 얻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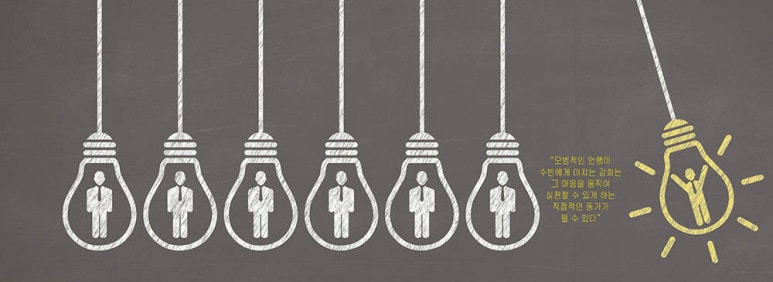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할까?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는 정신을 바탕으로 상제님의 말씀에 자신의 언행과 처사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일신을 주관하므로 바른 마음을 지니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는 정신에 거짓과 삿됨이 있을 수 없으므로 먼저 무자기를 바탕으로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양심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인데, 진실은 윤리와 도덕의 바탕이 된다.08 이 말은 양심에 근거한 언행은 인륜 도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기는 무자기를 바탕으로 윤리와 도덕을 준행함으로써 상제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수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상 자신의 언행과 처사를 돌아보고 살펴야 심신이 닦여진다. 도전님께서는 “내 몸을 내가 닦기를 힘써 나가려면 반성으로써 날에 날마다 내 몸이 새로워지도록 게을리하지 말아야 곧, 수기(修己)가 되는 것이다.”09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객관화하여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과 언행의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을 객관화하여 매 순간 자신이 어떤 언행과 처사를 하는지 의식하며 도리에 어긋나는 언행과 적절치 못한 처사는 삼가도록 성찰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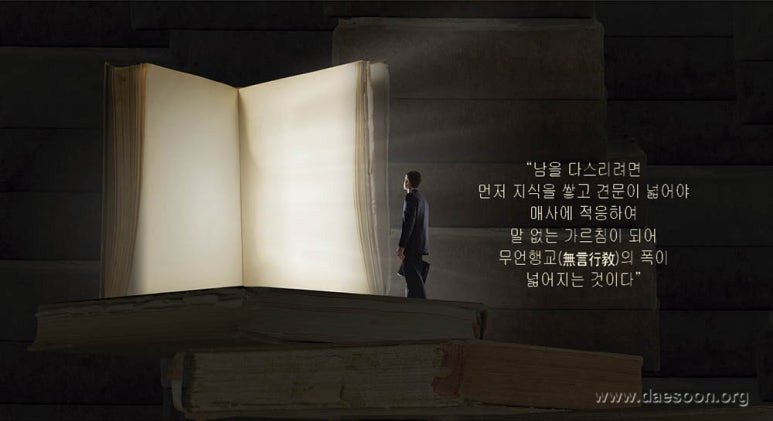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이치와 도리에 맞게 처신 처사하려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옛 성현들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독서를 많이 한 이유도 천리(天理)에 따라 매사 적중하게 처사하기 위해서였다. 다양한 상황과 사람을 이해하여 너그럽고, 적중하게 처사하려면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견문을 넓혀야 한다. 도전님께서는 이에 대해 “남을 다스리려면 먼저 지식을 쌓고 견문이 넓어야 매사에 적응하여 말 없는 가르침이 되어 무언행교(無言行敎)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10라고 말씀하셨다. 이치를 알아야 이치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박람박식(博覽博識) 할수록 처신 처사의 폭이 넓어져 좀 더 이치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고 보는 이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 사람을 불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식견과 지혜를 넓히기 위해 힘쓰는 것이 자신의 수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성장이 우선이다.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이다. 또한, 가르침은 강요와 지시가 아닌 몸소 실천하는 것이 근본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요와 지시는 반감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본보기가 되는 언행과 처사는 따뜻한 감화와 자연스러운 체득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수기는 자신의 완성을 향한 길임과 동시에 후각을 참된 도인으로 이끄는 선각의 소임이다. 그러므로 자기반성과 솔선수범을 근본으로 한 수기의 자세가 선각과 후각이 함께 도통진경에 이르는 상생의 수도임을 다시금 새겨본다.
01 「도전님 훈시」(1985. 8. 7) 참고.
02 교법 2장 26절. 『대학』 상장은 경 1장을 말하는 것으로 ‘삼강령[三綱領: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지어지선(止於至善)]’과 ‘팔조목[八條目: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으로 이루어졌다. 삼강령에서는 명명덕이 수기, 신민이 치인에 해당하며, 팔조목에서는 수신 이하가 수기에, 제가 이상이 치인에 해당한다.
03 『논어』, 「헌문(憲問)」,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 其猶病諸.”
04 이광주, 「주자학과 대순사상의 수양론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제24-2집 (2015), pp.255-257.
05 공사 3장 39절.
06 『대순지침』, p.77 참고.
07 『대순지침』, p.70.
08 「도전님 훈시」(1985. 10. 19), “진실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의 참된 마음씨니,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 조상추모(祖上追慕)의 마음, 제자가 스승을 받들고 배우는 마음, 경신존천(敬神尊天)의 마음이다. 인간의 진실한 천품성(天稟性)이니, 이 천품성이 인간의 윤리 도덕의 바탕이 된 것이다.”
09 「도전님 훈시」(1985. 8. 7).
10 「도전님 훈시」(1985. 8. 7).
'대순회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곡고화과(曲高和寡) (0) | 2025.03.23 |
|---|---|
| 여유용(如有容) (0) | 2025.03.23 |
| 박람 박식(博覽博識) (1) | 2025.03.23 |
| 인연의 감사함에 대하여 (0) | 2025.03.23 |
| 포덕의 바른길: 해원상생의 실천 (0) | 2025.03.22 |
